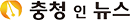배고프던 어린 시절 집주위에 피어난 찔레의 여린 햇순은 훌륭한 간식거리 중의 하나였다. 여린 가시를 제치고 햇순을 따서 씹으면 사근사근하면서도 그렇게 달짝지근할 수가 없었다. 그 때 그 맛이 입안으로 생생하게 달려온다. 찔레꽃을 보고 있노라면 순백색에 감히 넘볼 수 없는 고귀함이 깃들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거기다가 언젠가 읽었던 찔레꽃의 습성은 물론, 전설까지도 넝쿨째 딸려 온다. 찔레는 아무리 베어내도 뿌리만 붙어 있으면 끈질기게 되살아난다. 우리민족의 명운이 위험스러웠던 고려시대 몽고 침입과 찔레꽃 전설이 관련이 있는걸 보면, 그 끈질긴 생명력은 온갖 외침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천년 역사를 꿋꿋하게 지켜온 우리 민족의 저력과도 많이 닮아 있다.
원나라에 처녀 공출로 끌려간 찔레라는 여자아이가 우여곡절 끝에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동생을 찾아 산천을 헤매다 찾지 못하고 하얀 눈 위에서 죽었다. 죽은 찔레의 무덤에서 피어 난 꽃이 바로 찔레꽃이 되었다는 것이다. 꽃 색깔은 눈을 닮아 흰색이고, 애타게 가족을 찾아 부르던 그 목소리는 은은한 향기가 되었으며 가족을 사랑하던 그 마음은 빨간 열매가 되었다는 전설이다. 뭉긋한 슬픔이 묻어난다.
꽃을 좋아하는 기호도 나이에 따라 변하는 모양이다. 젊었을 때는 꽃이라면 으레 화려한 장미와 고귀함을 지닌 백합의 그 도도함을 좋아했다. 나이 들면서부터는 그러한 화려함이 오히려 부담으로 느껴지고, 바라보기 편하고 마음에 담담한 휴식을 주는 수수한 색깔의 야생화들이 더 좋아졌다. 홑꽃보다 겹꽃들이 좋았다. 이젠 동백꽃도, 벚꽃도, 봉숭아도 홑꽃잎이 더 좋다. 어딘가 모자란 듯하지만, 단순하고 왠지 담백하게 느껴지는 홑꽃잎에 마음이 더 끌린다.
산그늘 풀 섶에 아침이슬 머금은 채, 무리지어 피어 있던 수수한 찔레꽃의 향기 로움은 철 이른 무더위와 삶의 메마름을 보상해주고도 남았다. 지금은 그 자리를 계란 후라이같은 망초 꽃이 대신해 주고 있다. 상처받은 마음을 위안 받을 수 있고 치유 받을 수 있는 곳이 결국 자연이라는 말이 새삼 와 닿는다. 세상이 아무리 빠름 빠름으로 변해도 여전히 아날로그인 내 심장은 순리 따라 자연이 건네주는 행복과 그 힘을 그리워한다. 저어기 플라타너스 잎 끝에 걸린 하얀 조각구름. 바람 불면 곧 떠나겠지만 잠시만 그대로 머물러주면 좋겠다. 달콤한 솜사탕 같은 조각구름 그 아래로 한웅큼의 하얀 그리움이 일렁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