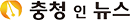충청남도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신 경 희

설사 그가 교장이 되지 않았더라도 아마 존경받는 훌륭한 선생님으로 남아 계실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이 예화를 떠올릴 때마다‘나는 정말 스승인가’하는 물음과 지금의 내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이, 지켜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고뇌하게 한다. 요즘‘스승은 학교 밖까지 책임지고, 선생님은 학교 안까지를 책임지지만, 교사는 자기 교실만 책임지고, 강사는 과목만 책임지면 된다.’는 웃지못할 이야기가 있다. 우리는 지금 스승과 강사사이 그 어디쯤에 서 있는 것일까? 답변이 혼란스러운 시대다. 그것은 교사나 학생 모두가 변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래저래 스승으로 살아가기에는 힘든 세상이 돼버렸다. 그래서인지 교단생활이나 교육자의 길이 빈 집처럼 공허해질 때가 많다. 교육을 부르짖고 있으되 삶을 소모하고 있다는 허무가 밀려올 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그 헛헛함을 견뎌내야만 하는 걸까.
분명한 것은 사람이 있는 곳에 언제나 교육이 있어왔다는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여건이라도 아이들의 빛나는 꿈은 웃음과 눈물을 나눌 수 있는 스승의 가슴에서 이루어져 왔다. 여전히 교사는 스승이다.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교사는 단순히 수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스승인 것이다. 성적을 못 올려주고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못해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말과 응원을 해줄 수 있는 영원한 스승인 것이다.
슬픔의 줄기 같은 빗줄기 사이로 바람이 통으로 불어대던 지난주일. 남은 꽃잎들이 하염없이 떨어져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는 내 마음도 하염없이 떨어져 내렸다. 세상사 모든 것이 마냥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느끼며 아쉬움으로 가득 차오르던 오후였다. 아카시아 향기 너머로 영혼까지 매끈해지는 오월. 여리고 순한 잎들이 찬란한 햇살을 만나 성숙해지는 오월에는 송이송이 저며 드는 찔레꽃처럼 살 속에 묻어 둔 그리움 꽃 피우며, 징검다리 돌을 바로 놓는 마음으로 임하는 참 스승으로 넘쳐나는 교실을 학교를 꿈꿔 본다.
올해 스승의 날은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기념식도 취소하고 애도주간으로 차분히 진행된다고 한다. 교육에 대한 소신과 열정과 고뇌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자신의 위치에서‘나는 누구인가’아는 것이 지혜이다. 입으로만‘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해서는 공허하다.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우리가 걷고 있는 삶이 때때로 허접하게 여겨져 슬플 때가 있다. 하지만 고난과 상실 가운데서도 그것을 빚어 멋진 꽃을 피워내는 데에 교육의 위대함이 있는 것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