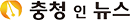충남교육청 장학관 신경희

오색 단풍 중에 최고는 단연코 참나무 잎이다. 핏빛처럼 붉은 애기 단풍도 물론, 아름답다. 허나 참나무 잎만 할까.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다. 참나무는 황금빛으로 가을 산을 빛나게 해준다. 채도가 높은 연한 노랑에서 황금빛으로 변하고, 몇 번의 서리를 맞으면서 갈 빛으로 깊어져간다. 낙엽이 수북이 쌓인 길을 걷노라면 겨울부터 걸어 온 나무의 생(生)이 온 몸으로 전해져 온다. 봄에는 또 어떠한가. 참나무는 연두 빛 세계에서도 단연 빼어나다. 울릉불릉 봄 산을 부드럽고 한층 우아하게 수놓는다. 한 번 쯤 눈여겨 본 사람은 다 안다.
‘참나무’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참 잘도 지었다는 생각이 들게 해 주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십 오년 전에 오두막을 지으면서 작은 벽난로를 앉혔다. 늦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아이들과 함께 해온 나무로 불을 지피곤 했다. 소나무, 참나무, 잡목을 가리지 않고, 불을 지피면서 어떤 나무가 죽어서까지 진짜 나무인지를 알게 됐다.
소나무는 송진 그을음으로 내화 유리문을 어지럽혔고, 잡목들은 불빛도 지지부진 그렇게 타버렸다. 참나무는 달랐다. 재질이 단단하여 소리 없이 타면서 밑불이 되어 주고,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화려하고 멋진 불꽃은 연기와 그을음 한 점 없이 황홀하게 타올랐다. 타다가 꺼지면 참숯이 되어 다시 불을 일으켜 주었다. 그 때 알았다. 나무 중에 으뜸은 정말 참나무라는 것을.
참나무는 그 종류도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신갈나무’는 옛날 짚신 바닥에 깔았던 나뭇잎이라 하여 신깔나무라고 불리다가 이름 붙여졌다. ‘갈참나무’는 잎이 가을 늦게까지 달려있고, 단풍의 색깔이 눈에 잘 띄는 황갈색이라서 가을 참나무로 불리다가 ‘갈참나무’가 됐다는 설이 있다. ‘졸참나무’는 참나무 중, 잎이 제일 작기 때문에 졸병 참나무란 뜻에서 이름이 붙었다. 참나무 중, 가장 작은 도토리가 열리지만 가장 맛있다고 한다. ‘떡깔나무’는 예부터 조상들이 잎으로 떡을 싸서 보관하였는데, 그만큼 넓은 잎을 가진 나무라는 뜻이다. 실제로 잎에는 방부물질이 있어 음식보관에 도움이 된단다.
사람도 참나무 같은 존재가 있다. 말없이 다른 사람의 밑불이 되어주고, 따뜻한 온기를 내는 사람. 자신을 내어주고도 티도 내지 않는다. 더 바라는 것도 없다. 그냥 이 땅에 와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다 돌아간다. 알프레드 테니슨은 그의 시 <참나무>에서 ‘인생을 살되, 젊거나 늙거나 참나무처럼 살라’ 했다. 세상에 참나무 같은 믿음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많아지길, 기왕 사는 거 참나무 같은 삶을 살아야지.
늦가을 햇살이 창문을 기웃 넘어와 발치에 머물고 있다. 건드리면 깨어질 것 같은 파란 하늘, 바람은 교교하면서 차갑다. 낙엽들이 수선수선 구르고 있다. 이런 날은 그리운 사람과 참나무 잎이 구르는 늦가을 낭만을 걷고 싶어진다. 가슴이 만든 길을 따라가다 보면 참나무 같은 그대를 만날 수 있을까. 한잔 하늘이 깊고 쓸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