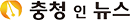충남교육청 장학관 신경희

요즘 구부러진 길을 찾기란 쉽지 않다. 새로 나는 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대부분의 길들이 직선으로 쭉 뻗어 있다. 그러다보니 특별한 곳을 찾지 않는 한 오솔길 같은 길을 만나기가 어렵다. 나는 성격이 이상한지 곧은 길 보다 구불구불하고 한적한 길이 좋다. 나무도 구부러진 나무가 더 좋다. 특별이 옹이진 나무에게는 한층 정이 간다.
이유는 단순하다. 운치도 운치려니와 직선보다 곡선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굽었다는 것은 높은 곳만 바라보지 않고 낮은 것을 살피며 무언가의 아픔을 견디며 열심히 살았다는 징표 같아서다. 쭉쭉 뻗은 낙락장송도 품위가 있지만 휘휘 구부러진 나무들도 나름대로 멋이 있지 않던가. 쉼 없이 낮은 곳 찾아가는 냇물도 뱀처럼 구불구불 흘러간다. 자연은 곡선 닮은 여유와 아름다움이라서 좋다.
최근 교보생명 광화문 글판이 여름 편으로 새 단장을 했다. 유월부터 이준관 시인의 '구부러진 길'이 올라왔다. <구부러진 길이 좋다. 들꽃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에 급급해 자칫 놓치거나 소홀해지기 쉬운 것들을 생각해보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듯하다.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흙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그의 시는 직선으로 뻗은 아스팔트 도로가 아닌 구부러진 흙길 같다. 시를 읽고 있노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우리는 반듯한 길, 조금이라도 쉽게 가려고 얼마나 애써 왔는가. 하지만 남보다 빨리 가려는 직선의 길에서 만난 것들은 속도와 상처였다. 편리함과 빠름을 쫓는 직선의 시대에 반듯한 길 쉽게 직선으로 가려다 보니 우리네 삶이 여유롭지 못하고 고달프다. 광화문에 떠오른 글판이 올 여름 우리들의 모난 마음을 다듬어 주고, 고달픈 삶을 쓰담쓰담 해주길 간절히 바래본다.
날이 더워지면서 장거리 통근 길이 점점 버거워진다. 이런 때, 이번 현충일처럼 주말과 연결된 휴일은 반갑기 그지없다. 덤으로 얻은 휴식 같은 시간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단독주택에 사는 덕분으로 여기저기 손 갈 곳이 많아 휴일에도 바쁘지만 그 자체가 힐링이다. 구지 땅을 밟고 풀을 뽑으며 사는 이유라면 이유다. 어디선가 김광석의 노래가 들려온다. 듣고 있노라니 인생이라는 열차가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 같다. 삶의 리듬으로 달리는 그 열차 안에 내가 타고 있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베란다 데크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신다. 고요한 부름에 귀를 기울여 본다. 내면의 목소리가 나직하게 들려온다. “조금 둘러가도 괜찮아. 너무 빨리 달리지 말자.” 지금의 삶은 어쩔 수 없이 직선의 고속도로를 달릴 수밖에 없지만 구불구불한 길을 가듯이 꽃도 보고, 별도 보며 천천히 즐기며 가자. 조금 더디더라도 인간미 넘치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보자.